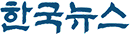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고질적 난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천시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서울·경기 일부 지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만큼은 명확하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수도권의 쓰레기를 가장 큰 부담으로 떠안아왔고, 더는 뒤로 미룰 여지도, 양보할 여지도 없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종착지 역할을 해왔다.
서울과 경기의 인구 증가·도시 확장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증가를 인천이 대신 감내해온 셈이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 침해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으며, 악취·미세먼지·침출수 문제는 지역 갈등의 중심이었다.
이번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이 수십 년간 견뎌온 환경 부담을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선언이다.
그럼에도 서울·경기 지자체들은 “대체 시설이 없다”, “지금은 어렵다”는 말로 인천시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 의지가 아니라 시간 끌기다.
폐기물 직매립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
실제로 다수 지자체는 수년간 소각장 확충과 재활용률 개선 과제를 알고도 주민 반발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아왔다.
인천만 희생하고, 다른 지자체는 외면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가 내놓은 직매립 금지 로드맵은 분명한 원칙 위에 세워져 있다.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자체에는 더 이상 관행적으로 매립지 문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폐기물 정책 구축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소각·재활용 중심의 처리 체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수도권 어디에서도 ‘제2의 매립지’는 등장할 수 없다. 인천의 결단은 그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게 만드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물론 인천 스스로도 완전한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자체 소각 용량 확대, 재활용률 강화,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인천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을 인정하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서울·경기가 보여주는 태도는 여전히 ‘인천에 의존해 왔던 과거로의 회귀’에 가깝다.
직매립 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인천을 압박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수도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한 도시의 인내와 희생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인천의 결단이 수도권 폐기물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